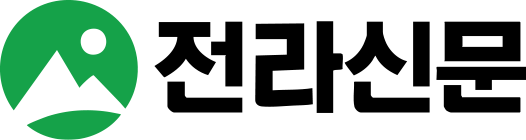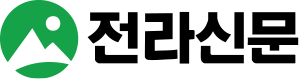(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시의회가 또 한 번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비위·일탈 논란에 휩싸인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가 ‘공개 사과 2명, 경고 8명’이라는 사실상 면죄부 수준으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수차례 반복돼 온 지방의회의 자기 보호 본능,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결정이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과 특권처럼 다룬 책임을 이렇게 가볍게 털고 가겠다는 것인지,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이번에 도마에 오른 비위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공공지원 사업이 특정 의원과 그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 배우자가 재직 중인 기관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여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한 행태, 대규모 재난과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도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강행한 일까지, 하나하나가 공직윤리의 최소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른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윤리특위의 결론은 ‘공개적으로 한 번 사과하고, 또 한 번 경고하자’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서는 “결국 솜방망이 징계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거둘 수 없다.
절차 또한 문제다. 논란은 최소 수개월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시의회는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시점에서야 뒤늦게 의원 10명을 한꺼번에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자문 기구의 의견과 징계 수위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다수 정당과 소수 정당 소속 의원에게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가 결정된 뒤, 일부 징계 대상자들이 다시 ‘우수 위원’으로 선정되는 자화자찬 쇼까지 더해지면서, 윤리 시스템 전체가 ‘면죄부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주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처럼 봉합하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민주주의에 돌아간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견제와 감시 기능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행정은 폐쇄적 관료주의와 이익 집단 정치에 더 취약해진다. 또한 “어차피 징계 받아도 경고 아니면 사과”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의원들 사이에 자리 잡을 경우, 오늘의 일탈은 내일의 더 큰 부패로 되돌아올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지금의 결정을 “최선이었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수준의 징계로 귀결됐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제는 ‘징계 쇼’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꿀 때다. 첫째, 의원 비위와 이해충돌 사안을 다루는 윤리심사와 징계 절차에 외부 시민위원과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의 내용과 표결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이해충돌 방지·업무 관련 예산 배분·해외 연수 등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회 수준을 넘어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최소 정직·제명까지 갈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징계 의원에게 각종 ‘표창’과 ‘우수 위원’ 선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스스로에 대한 포장과 면세를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 개편 과정을 전주시의회 혼자서 밀실에서 짜지 말고 시민사회와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약속이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이미 끝난 일”로 넘길 생각을 접어야 한다. 비위와 일탈은 어느 지방의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재발을 막는 시스템으로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의회의 수준이 갈린다. 스스로를 감싸는 데 급급한 의회는 결국 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그 자리를 더 과격하고 반정치적인 정서가 채우게 된다. 전주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를 향한 온정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냉정한 책임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