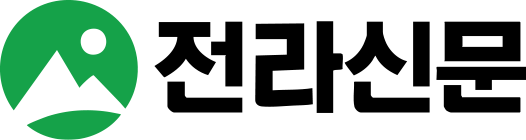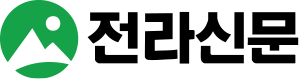(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 부안군이 변산면 호텔 부지를 민간업체 자광에 매각한 뒤, 잔금조차 받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해온 사실은 단순한 지방행정의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행정의 기본 법칙이 무너지고, 공공성과 책임이 정치적 계산에 종속된 구조적 붕괴의 징후다.공공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절차다. 그러나 부안군은 ‘대규모 관광투자 유치’라는 구호 아래 잔금 납입 기한을 넘긴 기업에 아무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
법은 명확하다. 공유재산 매각 계약에서 잔금 미납은 해지 사유다. 그럼에도 계약이 유지됐다면, 이는 행정의 고의적 방조이자 정치적 결탁의 결과다. ‘기업 유치’의 명분이 공공의 원칙을 덮은 순간, 부안군의 행정은 군민이 아닌 기업의 편에 섰다.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부안군만의 일이 아니다.
지방정치의 곳곳에서 ‘투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유연하게 해석되고, 기업과 행정의 유착이 묵인되는 사례는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자율을 명분으로,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사실상 방관해왔다. 그러나 자율을 빌미로 책임을 회피한 결과가 바로 이런 사건이다.
지방정부의 공공자산이 사기업의 이익에 묶이고, 행정의 투명성은 손쉽게 거래되는 현실은 중앙의 제도적 감독 실패가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많은 지방재정 점검과 공공자산 실태조사를 반복해왔으면서도, 이런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
감사원이 매년 수백 건의 지방행정 비위사례를 적발하지만,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지방정부는 정치인들의 ‘성과 홍보 수단’으로 기업 유치를 내세우고, 중앙정부는 ‘지역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기업-행정 간 특혜 구조를 방조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 사태로 또 한 번 증명됐다.
더 큰 문제는 정치다. 지방행정의 무책임은 정치의 계산 아래 자라난다. 군 단위의 토지 매각 하나조차 정무적 의중이 작동하고, 특정 세력의 입김이 스민다. 군단위의 실무 공무원이 계약 위반을 알고도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의 꼭대기에서 ‘괜찮다’는 신호가 내려오기 때문이다.
결국 부안군 사태는 지방행정의 실패인 동시에, 정치권력의 도덕적 해이 그 자체다.이런 상황에서 “행정 실수”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책임은 명확해야 한다. 부안군은 당장 잔금 미납 사안을 재조사하고, 어떤 결재선과 정무 판단이 개입됐는지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미이행 공유재산 매각 사례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 계약에서 정치적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장치도 강화되어야 한다.공공의 자산을 관리하는 정부의 무책임은 곧 민주주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지금 지방행정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묵인된 특혜’가 쌓이면, 국민은 더 이상 중앙정치의 감시 기능조차 신뢰하지 않게 된다. 부안군의 변산호텔 부지 사건은 지방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행정 전체의 경고음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쇄신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율보다 우선되는 국가적 책무가 ‘공공성의 수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안군의 사태는 한 지방의 행정 불감증이 아니라, 권력의 감시 기능이 해체된 국가적 위기의 축소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