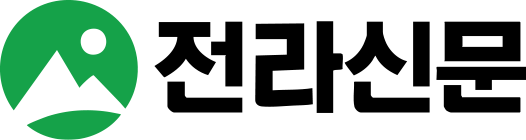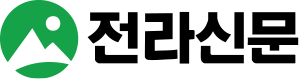(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며 출발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갈등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업은 정권 변화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렸고, 환경논쟁과 정치적 이해가 얽히며 표류를 거듭했다.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새만금은 환경 보전과 개발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정부는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사업을 재검토했고, 그 결과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깨졌다.
환경보전의 가치 자체는 분명 소중하지만, 균형 없는 의사결정은 지역경제를 뒤흔들고 국가적 투자 계획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환경단체의 우려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새만금에 대한 반대로만 일관한 태도는 발전의 현실적 필요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진정한 환경정책은 ‘멈춤’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찾는 데 있어야 한다.
새만금은 이제 더 이상 과거 논쟁의 연장선 위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다. 정권 교체에 따라 방향이 흔들리고, 단체의 압력에 따라 계획이 멈추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또 다른 30년이 허비될 뿐이다.
정부는 현실적 개발과 환경의 공존이라는 원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국가 프로젝트로 새만금을 완성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새만금은 지연의 상처를 넘어 미래의 상징으로 거듭날 것이다.